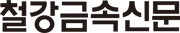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실증되곤 한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질적인 면에서 우리 철강산업은 최근 10년간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가 주도로 최근의 변화는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인 2003년 철강재 총수요는 5,950만톤(내수 4,540만톤, 수출 1,410만톤) 정도였다. 10년 뒤인 2012년에는 8,450만톤(내수 5,400만톤, 수출 3,050만톤)으로 증가했다. 10년새 무려 2,500만톤, 42%가 늘어나 높은 성장을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다. 내수와 수출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약 860만톤 대 1,640만톤이다. 수출이 총수요, 다시 말해 국내 철강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로 공급 측면을 보면 철강재 생산량은 5,330만톤에서 7,200만톤으로 1,870만톤, 35%가 늘어났다.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꾸준하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공급원인 수입 역시 1,560만톤에서 2,070만톤으로 510만톤, 33% 증가해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내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음에도 수입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내수를 웃도는 생산 증가가 이뤄졌다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수급 측면에서 우리 철강산업은 불안정한 성장, 내지는 기형적으로 몸집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형적 현상은 수입재의 시장점유율이라는 통계자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된 물량이 전량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가정하에 내수 시장에서 수입재 비중을 나타내는 단순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3년 25.6%였던 것이 2008년 33.1%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축소돼 2012년에는 27.7%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유수의 철강 강국 중 우리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수입이 이뤄지는 특이한 구조가 우리 철강산업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수출 역시 이러한 기이한 구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 철강업계나 정부, 관련 기관들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개선의지가 약하다. 철강산업이 태생부터 과거 상당기간 상공정 위주의 수입이 불가피한 구조를 가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연강판을 수입해 냉연판재류나 강관을 만들어 내수로 사용하고 또 수출하는 것이 우리 철강산업이었다.
그러나 철강 산업구조는 이제 상하공정의 균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 수입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지금 수입은 상당 부분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순 상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기형적 볼륨 커지기를 막고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량 축소가 선결과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구조 속에 수출 확대는 통상 마찰 등 우리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들 뿐이다.
(사설) 철강산업 볼륨만 커진 것 아닌가?
- 철강
- 승인 2013.02.27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