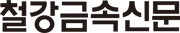2013년 철강재 수출입 실적을 보면 대략 2,920만톤을 수출하고 1,940만톤을 수입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해 순 수출량이 무려 980만톤에 이른다.
2010년까지만 해도 순 수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불과 3년 만에 천만톤 가까이 수출 초과로 바뀌었으니 격세지감이라면 격세지감이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능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철강산업의 문제이자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철강산업 전반의 무역 비중이 너무 높다. 철강재의 내수 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대략 5,100만톤을 조금 넘는다.
생산량은 7,100만톤 수준으로 대략 2천만톤 정도는 수출을 해야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 지난해 수입량 1,150만톤(반제품 등 제외)을 고려하면 3천만톤이 넘는 수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내수+수입) 규모 6,250만톤에 비해 4천만톤이 넘는 수출입 비중은 우리 철강산업의 무역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어떤 산업이건 수출이 많은 것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등 좋은 일이지만 과도한 무역 의존은 좋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철강의 경우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수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무역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수입을 줄이는 것이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공정 부족에 따른 필수 수입은 상당히 줄고 단순 유통용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 유통용 과다 수입은 품질 문제는 물론 가격 제한 요인 등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불량 부적합 수입재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또 저가로 인해 국내산 제품의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철강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냉연판재류, 강선 등 고급 제품의 수입 증가는 향후 결정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국가별 수출입을 보아도 문제는 여전히 크다. 수출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다변화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중국, 일본에 극한적으로 몰려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 수입의 무려 90% 이상이 이들 2개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세계적 공급 과잉을 유발시키고 있는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는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은 그야말로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까지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나 또다시 급증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냉연판재류, 형강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철강산업의 활로를 찾기는 어렵다.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업계와 정부의 특단의 수입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특단의 철강 수입대책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4.03.24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