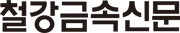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치맥! 친구들과 함께 먹는 치킨과 맥주는 최고죠. 그래서 ‘깐부’는 완벽한 자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 O)는 10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 장소를 ‘깐부치킨’으로 정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치킨 회동 중 맥주를 들고 일어나서 러브샷을 하며 우정을 과시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APEC 기간 중 흥미로운 뉴스라면 단연 이 CEO들의 만남이었다. 더군다나 오랜 친구를 상징하는 ‘깐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K-치킨집이라서 의미를 더했다.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에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GPU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얘기를 들은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이것은 인공지능(AI) 산업 지형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GPU는 단순한 그래픽 카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뇌를 바꾸는 ‘AI 대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AI 대 혁신을 꿈꾸는 정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젠슨 황은 대만계 미국인이다. 혹자는 그가 창원 황씨가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풀어 놓은 선물 보따리가 상상 밖이었기 때문이다.
GPU(Graphics Processing Unit)는 원래 게임 그래픽이나 영상 렌더링용으로 쓰이던 칩이다. 하지만 지금은 AI의 심장으로 통한다. 인공지능 학습(예: ChatGPT, 자율주행, 생성형 AI)은 수천 개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CPU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GPU는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어서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AI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AI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GPU 분배도 흥미롭다. 정부 5만 개,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 각각 5만 개, 네이버 6만 개다. 이 GPU를 활용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AI를 적용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로보틱스 기술을 AI 학습 기반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AI와 검색엔진, 하이퍼크로버 X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더 정교하게 키울 수 있다. 정부는 국가 AI 클러스터 구축이 앞당겨진다. 그야말로 한국 전체 산업에 ‘AI 엔진’을 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AI 경쟁력 수준은 세계 3위이다.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3위권 그룹에 속한다고 평가받는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90%를 미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위권은 의미가 크지 않다. 우리가 ‘AI 3대 강국’을 얘기할 때는 1, 2위 수준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토양은 비옥해지는 데 농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문제다. 아무리 AI의 심장인 GPU를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그림의 떡’ 일 뿐이다.
AI 3대 강국을 외치는 한국이 인재 육성·경쟁력은 세계 49위 ‘낙제점’이라는 사실이 희망을 꺾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5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 6위에서 9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인재 부문 경쟁력 순위는 전년보다 30계단이나 떨어진 49위에 그쳤다. 규제 부문은 전년보다 20계단 하락한 38위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AI 3대 강국 진입은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농토를 갖고 있어도 경작할 농부가 없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전문가들은 “AI 패권 경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재를 중심으로 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단기적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인재의 순환과 성장 구조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인재 육성 부문에서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나라가 AI 3대 강국을 꿈꾸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도 밀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를 앞선 나라들은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이것부터 본받아야 따라잡을 수 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트렌디함을 보여주는 기업이 생존하고, 그런 CEO에 열광한다. 여기서 말하는 트렌디함은 ‘생각’을 말한다. CEO들의 자유로운 행보는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게 한다.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친밀함이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치킨을 먹고, 깐부라는 용어에 큰 의미를 두고 가게를 골랐다. 러브샷을 보여주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젠슨 황을 비롯한 3자 회동이 그랬다. 기업 생존을 위한 만남이라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는다. AI 성공도 마찬가지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이 따라야 마침내 가능하다. 이들 세 CEO의 만남을 보며 얻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