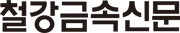겨울은 길고 봄은 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유럽연합(EU) 철강 수요 전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OECD는 유럽 철강 시장이 올해까지 침체의 터널을 지나, 내년에서야 비로소 인프라와 국방 투자를 발판 삼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희망적인 ‘턴어라운드’ 예고처럼 들리지만, 보고서의 행간을 뜯어보면 유럽 철강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수요가 살아난다고 해서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OECD의 루차노 지우아 경제학자가 지적한 구조적 리스크들은 유럽 철강에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을 것(春來不似春)’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선 당장의 ‘보릿고개’가 너무 가혹하다. 유럽 경제를 지탱하던 건설, 자동차, 기계 산업이 동반 부진에 빠졌다.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유럽 전역의 제철소들이 주문 감소로 신음하고 있다. 2025년이 바닥이라지만, 그 바닥은 깊고 차갑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이후다. OECD는 회복의 동력으로 ‘국방’과 ‘인프라’를 꼽았다. 민간 소비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지정학적 지출이 시장을 견인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물건을 팔 시장이 열려도, 물건을 만들 ‘체력’이 바닥이면 소용이 없다.
이는 에너지 비용이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이다. 현재 EU 제철소들은 구조적인 고비용 체계에 갇혀 있다.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렴한 에너지를 펑펑 쓰는 다른 지역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유럽의 코스트 포지션(Cost Position)은 처참한 수준이다.
OECD가 “EU의 경쟁력 회복에 대해 낙관보다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비용이 높으니 갈수록 마진이 줄고, 마진이 없으니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탄소중립 딜레마도 풀어야 한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를 외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무역장벽까지 세웠다. CBAM과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으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있지만 높은 에너지 비용과 금융 비용으로 허덕이는 철강사들이 과연 막대한 자금이 드는 ‘탈탄소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친환경 전환을 이뤄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결국 2025년까지의 시간은 유럽에게 단순한 ‘버티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탈탄소 로드맵을 재조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철강시장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열린 SMK2025 아젠다 컨퍼런스는 철강·금속 업계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구조적 불황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구조 재편과 인공지능(AI) 및 첨단소재 중심의 기술 혁신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다. 이러한 공감대가 단순히 인식의 공유뿐 아니라 실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