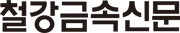t상생의 진정한 의미는
세 밑 차가운 대설(大雪)의 차디찬 바람이 눈과 함께 휘황한 거리에 몰아친다. 때 이른 크리스마스 케롤이 스산한 거리에 울러 퍼지지만 이 땅의 직장인들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다. 마감에 휘둘리고 실적에 마음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위태로운 세상살이가 힘겹기만 하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 우리 경제는 소외된 직장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대기업의 횡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전국의 많은 중소기업이 있다. 상생(相生)의 허울 좋은 이름아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내몰린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돌아오는 어음 막기에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소속된 종사자들은 박봉임에도 제때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부디 해고만은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허드렛일도 마다치 않는다.
600만여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는커녕 목숨만 연명하면 다행이라는 그들을 매몰차게 거리로 내모는 기업도 많다. 그리고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들은 미생의 장그래 처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도 어디에 가서 억울하다 말 한마디 못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안타까운 의무 때문이다.
미래가 불안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면 위화감밖에 생기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것이다. 정규직의 풍족함은 비정규직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길 줄 알았지 비정규직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많았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던 우리의 옛 인정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내가 바부르다 하여 타인의 배고픔을 외면하다 못해 희생까지 강요한다면 진정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당장 시선을 돌려 소외된 직장인이 없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 장사를 잘한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그들을 배부르게 해준 하청 기업들은 원가절감 요구에 적자 난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어야 한다. 더불어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비정규직도 보너스는커녕 재계약에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둘 이상 서로 공존하며 살아간다’라는 상생(相生)의 사전적인 의미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대설(大雪)의 칼바람이 왜 이렇게 매서운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