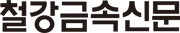광복 이후 한국의 경제사를 돌아봤을 때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상징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두 사람 모두 고인이 됐지만, 생전 모험과 도전으로 일궈낸 성공 신화는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정주영이 뚝심과 저력으로 현대를 키워나가는 동안 다른 한편엔 그의 영원한 맞수 삼성 이병철이 있었다. 두 사람은 경쟁자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국 경제를 부흥시킨 일등 공신이다.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였던 그들은 전사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 정주영이 ‘이기는 사업가’였다면 이병철은 ‘지지 않는 사업가’로 회자된다. 자신들의 신념을 기업 경영 속에 구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은 혈투도 서슴지 않았던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었다. 뚝심과 저력, 빈틈없는 태도와 날카로운 시선, 경쟁 관계를 즐겼던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기업가의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성격 또한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주영은 자신이 그린 청사진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또한 자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직원들을 끝까지 이끌고 갈 정도로 열정과 배짱이 두둑했다. 반면 이병철은 매사에 신중하고 치밀했으며, 빈틈없이 엄격했다.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려 애썼고, 놀라울 정도로 감정 조절을 잘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이 고스란히 사업 역량으로 발휘되어 현대와 삼성그룹이 탄생했다.
두 사람의 삶은 자신들이 지은 당호와 닮았다. 정주영이 ‘아산(峨山)’ 곧 높이 솟은 우람한 산 위 생을 살았다면, 이병철은 ‘호암(湖巖)’ 곧 호숫가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서 있는 바위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은 선택과 집중의 기업 탄생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건설, 중공업, 자동차 산업에 주력하는 현대와 금융, 서비스, 전자, 반도체 산업에 주력하는 삼성의 기업 풍경 토대는 바로 그 특징적인 삶에서 그려졌다.
덧없는 세월 속에 두 사람은 한국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기고 영면했다. 지금은 2세 경영을 거쳐 손자인 3세가 나란히 그룹 부회장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을 잇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끄는 리더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3세 경영을 하지만 두 그룹의 경쟁 구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경쟁은 여전하다.
‘적과 동침’이라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최근 두 사람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정의선 부회장과 현대차 임원들이 13일 충남 천안 삼성SDI 공장 방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인 이곳은 반도체를 대신하는 사업으로 삼성이 공을 들이는 곳이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손님을 맞았다. 현대차그룹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재계는 두 사람의 만남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새로운 협력 가능성 타진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로운 전기차 로드맵을 위한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과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정 부회장이 삼성의 전고체 전지기술력에 관심을 보였지만, 회동 이면에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안정화되어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중 하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해 양사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처럼 삼성의 청원(請願)도 눈여겨 볼만 하다.
오랜 일본 식민 지배를 끝내고 폐허와 공허만이 남은 한국 경제에 홀연히 등장해 허상의 빵이 아닌 실질의 양식을 주었던 정주영과 이병철이 있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 확연히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천국에서 손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 기업의 목적인 영리 추구와 이윤 획득에 충실하고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풍토가 됐다. 이렇듯 두 왕 회장이 생각지도 못한 변화된 기업 환경이 혁신의 바람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두 손자의 만남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