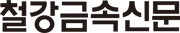노랑 봉투에 대한 기억은 아련하다. 월급봉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월이 흐른 지금 월급은 노랑 봉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월급이란 말도 잊히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연봉으로 바뀌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 돈이 12개월을 나눠 입금된다. 그 돈은 열심히 일한 당사자는 구경 한번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스란히 아내의 관리 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봉급날 대폿잔을 기울이던 낭만도 사라졌다.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직장인의 현실에 큰 비애(悲哀)를 느낀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월급은 노랑 봉투로 받았다. 지폐를 넣은 두둑한 봉투 속에는 동전도 들어 있었다. 봉투를 거꾸로 들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가던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다. 월급봉투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아내의 품이 아니다. 회사 근처 술집이나 식당이었다. 당겨 먹은 외상값을 갚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고 나면 대폿집을 찾아 고단했던 한 달의 회포를 풀곤 했다. 봉투에는 수많은 애환이 담겨 있었기에 젓가락 장단에 부르던 유행가는 처량하고 구슬펐다.
봉투 속에는 돈과 함께 한 달의 인내가 담겨있었다. 상사에 내어 준 간과 쓸개가, 상사에 고개 숙인 머리가 들어있었고, 상사에 굽신거렸던 비겁한 허리가 들어있었다. 뙤약볕에 검게 탄 얼굴이, 더러워도 참고 아부했던 입이 들어있었고, 보고도 못 본 척한 눈이, 자신을 욕하는 소리에도 참아야 했던 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흩뿌린 피와 땀이, 피로에 축 처진 어깨가 들어있었다. 삭막한 사회로 상처 입은 황폐해진 마음은 덤으로 끙끙 아픈 속앓이를 했다.
이렇듯 생각하면 헛헛하지만 그 봉투는 가정의 소중한 윤활유였다. 박봉을 쪼개어 주택부금을 넣고, 자식들의 학비와 쌀과 연탄을 사고 나면 어느새 생활비는 바닥을 보였다. 한 달 살기도 빠듯했기에 또다시 다음 월급날을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그 어려움을 스무고개처럼 하나씩 힘겹게 넘어왔다. 늘 모자랐지만 노랑 봉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 집 마련과 아이들이 훌륭하게 키운 것은 노랑 봉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가장의 노고가 컸고 아내들의 헌신도 컸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봉급은 직장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봉급은 제때 나와야 하고 고임금이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임금체불이 해마다 1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가 놀랍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라고 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의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이 현실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처참하고 억울하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몬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문제 해결에 무감각하다. 각종 구제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허수아비다. 더구나 임금체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검찰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고의로 임금을 떼먹는지 확인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는 엄벌에 처한다고 한다. 아울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엄정 대응한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던 악덕 사업주들이 철퇴를 맞게 생겼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월급날 고등어 한 손과 붕어빵을 사들고 육자배기 흥에 겹던 아버지가 그립다. 돌덩이 같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들만큼은 잘 돼야 한다며 박봉을 쪼개 과외를 시키던 아버지…. 그 노랑 봉투가 희망을 싹 틔우는 씨앗이었다. 임금체불은 가정의 희망을 꺾는 죄악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서야 할 곳은 칼바람이 매서운 허허벌판이다. 박봉일지라도 때만 되면 챙겨주던 노랑 봉투 시절 사장님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