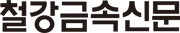한계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금융권 압박을 통해 이러한 한계기업을 솎아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업종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이다.
철강 공급과잉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26.1%에 달하며, 조선 과잉설비는 1,360만CGT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은 철강 12.8%, 조선 18.2%, 석유화학 10.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의 한계기업 비중보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 매출의 64.6%)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가 커지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IMF 상황과 유사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되면 비극은 금새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강업종을 볼 때 구조조정보다 시급한 것은 무분별한 수입재에 대한 적절한 방어전략 구축이다.
최근 중국의 SDR 편입과 다가오는 시장경제지위(MES) 획득 등은 세계 경제와 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직도 철강업체 70%가량이 국영기업인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고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여나간다면 ‘세계의 공장’을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어떤 강공책을 쓸 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산 철강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을 고치고도 소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일까?
- 철강
- 승인 2015.12.09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