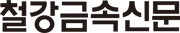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세계적 철강 공장을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자”
■ 외고집 철강 경영과 고로 제철소 건설의 꿈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장상태는 전자 산업을 해보라는 제의를 받는다. 동국제강이 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호의에 그는 “나는 이것저것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경영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경영자 장상태의 한 생애를 요약할 때 꼭 나오는 ‘철강인’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단호한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는 탐구적 집념과 오랜 철강공장 운영 경험을 통해 해박하고도 깊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통찰력으로 동국제강을 대표적인 철강회사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그의 소신이 추상같았던 권력의 핵 박정희 대통령의 제의에도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다.
부산은 창업자 장경호 회장과 장상태 회장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동국제강의 역사 중에서 반 이상 성장사를 간직한 용호동 공장(부산제강소)이야 말로 동국인들 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다. 장상태는 “우리에게 용호동 공장은 어머니의 모태(母胎) 같은 곳이다”고 했다.
하지만 용호동 공장 지대가 주거지로 확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력 생산기지를 부산에서 포항으로 옮기려는 구상과 전략은 꾸준히 추진됐으며 서쪽으로는 인천공장 설비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나아가 해외로의 무대를 넓히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도 꿈꾸었다.
부산에서 큰 기틀을 다지고 마산의 한국철강을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그다음이 인천항을 주요 기점으로 하는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72년 한국강업을 인수하며 그 꿈은 이뤄진다. 한국강업 인수 후 전기로 2대를 설치하고 인천공장 전기로 기술자를 3개월 동안 부산제강소에 파견해 기술을 익히게 했다. 그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야단도 많이 쳤는데 이것은 멋진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욕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난 후 마음이 편치 않아 따뜻한 말로 다독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세계적인 철강 공장을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자’는 그의 의지는 오래전부터 가슴 속에 품었다. 드디어 큰 걸음을 내디딜 기회가 찾아왔다. 1990년 6월 1후판 공장 준공을 계기로 인천공장의 다음 단계를 계획한다. 그 계획이 1991년 1월 인천 제2공장 건설이다. 인천 기존 공장 4만 평 부지에 연산 65만 톤 규모의 직류 전기로 공장과 50만 톤 규모의 철근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큰아들 장세주에게 건설 본부장을 맡겼다. 이미 큰아들은 1978년 입사해 여러 부서에 근무하며 바닥 체험을 한 이후였다. 10여 년 경력을 쌓았고, 나이도 불혹을 넘겼으니 이제는 야전 사령관다운 입장에서 큰 전략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련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 건설에 착수한 그 이듬해 1992년 11월 16일 인천공장은 인천제강소로 승격됐다. 다시 그 이듬해 봄(4월)에는 제2공장이 준공됐고, 그로부터 약 반 년쯤 지나 인천제강소는 드디어 제강 생산 100만 톤을 돌파하는 공장으로 우뚝 섰다.

훌륭하게 일을 수행한 아들 장세주를 향해 그는 뒤에서 “저놈아, 이번에 수고 많았구마. 내도 다 안다, 하지만 애비가 자식 칭찬 너무하면 안 좋은 기라. 내도 우리 창업자 회장님한테 무슨 칭찬 들은 기 있었던 가베? 전혀 그런기 없는 기라.”라고 말해 놓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흘렸다.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드디어 안도하는 순간이었다.
■ 포항에 편 새 웅지
동국제강 역사를 말할 때 포항제강소 건설의 의미는 매우 크다. 포항제강소 건설은 장상태의 비전이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건설의 역사는 그에게 있어 여러 해 동안 부하 장수들을 독려하며, 큰 싸움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큰 전쟁이기도 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장상태 한 사람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과 의미를 알게 해 주었다.
포항제강소의 첫 매듭은 1991년 6월 5일 1후판공장 준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신문들은 포항 1후판공장 건설을 매우 고무적으로 보았다. 신문에는 ‘포항에 편 새 웅지, 동국제강이 큰일 해냈다’는 헤드라인 제목과 ‘동국제강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산 70만 톤 규모의 중후판 생산 공장을 1991년 6월에 준공해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장상태 자신의 표현처럼 1후판 공장 준공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체계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 출발의 의미가 있었다. 동국제강은 포항 시대를 열며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포항제강소가 완공됐을 때 그는 극적이고 통 큰 지시를 한다.

“그동안 우리 동국 사람들은 이 공장을 짓는 일에 힘과 정열과 지혜를 쏟아부은 기라. 우째 한두 사람의 수고로 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쳤다. 본사고, 공장이고, 모든 임직원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하는 기라.” 그리하여 마침내 ‘동국제강이여 영원하라’ 라는 유명한 명문 기념 비석이 세워졌다.
■ 거리로 내몰릴 수 없다
IMF 파고는 동국제강을 비껴가지 않았다. 회장실 문을 열고 전경두 관리본부장(전무)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장상태는 그것이 사직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기 뭐꼬?”라고 물었다. 그것은 팀장급 이상의 사직서였다. 한참 후 그는 “내는 이런 것 받고 속이 편할 것 같으나?” 하며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어 비상 회의가 소집됐다. 임직원들은 모두 굳은 얼굴이었다. 사직서를 쓸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한편으로 어려운 시절에 한솥밥을 먹던 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경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훗날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싸움터에서 지휘하는 장수의 비정한 심정으로 단 한 사람 퇴출자도 없는 작전을 펼쳤다. 칠순의 노구를 이끌며 건강과 시간을 아끼지 않은 집념이 외환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큰 힘이었다.
■ 거목들의 만남과 우정
장상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사람은 육사 출신이며 직업군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 사람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포스코의 전 박태준 회장이었다. 그가 박정희나 박태준을 존경하거나 호감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권력 때문이 아니라 열정과 추진력 때문이었다.
동갑내기 박태준과 장상태가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은 공통된 관심사가 발단됐다. 합일점은 바로 쇠(鐵)였다. 장상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동국제강에 들어온 1950년부터 ‘쇠의 사람’이 됐다. 박태준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국가가 경영하는 철강회사를 세우라는 특명을 받고 포철 설립에 착수하면서 ‘쇠의 사람’이 됐다. 장상태는 박태준에게 쇠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세주 회장(학생시절)은 1960년대 자택으로 자주 찾아오던 박 회장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장상태가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장상태가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내가 이렇게 옛일을 회상하는 것도 그렇고,…참 아쉬워요.” 하며 슬픔을 되뇌이였다고 한다.
박태준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저 장상태는 나중에 뭔가 한 번 할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장상태는 30대의 나이에 박 대통령과 우정이라고 부를만한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 관계는 세상에 표나지 않게 지속됐다. 1979년 10월 박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맺기 사흘 전에도 궁정동 한 안가에서 술잔을 나눴다고 한다. 아무튼 두 사람은 만 10년의 연령 차이에도 메이지 않았던 꾸준한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도 비판을 받을만한 정경유착이 없었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는 큰아들 장세주에게 수시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아주 멀리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가까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큰 권력자들과 교분을 맺고 지내는 사이에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혜이자 교훈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