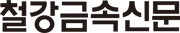지난 주 경산시에서 열린 ‘HIP기술 세미나’에 다녀왔다.
국내 최초의 HIP장비 도입업체인 코힙스테크에서 미터급 HIP장비 도입을 기념하여 관련 솔루션과 기술, 산업 동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기자가 눈여겨 본 것은 HIP기술의 활용처와 국내 산업계의 동향이었는데, 세미나에서 새삼스러운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HIP기술(열간등반성형기술)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장비는 물론 관련 기술과 부품소재, 완제품 제작까지 모두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에서는 HIP기술을 조선해양과 SMR, 우주항공과 신에너지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중국 견제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게 빼앗겼던 ‘제조업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또한 미국고 EU만큼은 아니지만 관련 장비는 물론 부품소재 등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미나의 패널들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HIP장비를 설계도 하지 못한다고 하며, 관련 소재부품과 기술 수준 또한 떨어진다고 한다.
철강업체들이 활용하는 롤 압연설비 등은 HIP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데 아직 국내 철강산업은 생산설비마저 핵심적인 분야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세미나에서는 철강 및 수요산업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 외에 금속3D프린팅 부품업체 대표도 만났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뿌리업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최근 금속3D프린팅과 용접, 주조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자빔 및 레이저 관련 기술은 일부 제품의 국산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뿌리산업은 물론 전체 제조업 부문에서 3D프린팅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속3D프린팅의 핵심기술인 레이저와 전자빔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당시 무역적자의 원인이었던 소재부품 국산화 정책을 추진했고,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 관련 정책이 실시되면서 현재는 소재부품산업이 무역 흑자의 일등공신이 됐다.
하지만 핵심적인 제조장비와 기술 측면에서 아직 국내 산업계가 선진국들과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극복해야만 국내 철강 및 뿌리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가 내년 증액한다는 R&D 예산에 철강 및 뿌리업계를 포함한 제조설비 및 공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