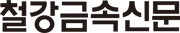근현대 철강산업의 발원지인 유럽이 친환경 철강, 이른바 그린스틸 사용을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린스틸 의무화 이슈는 지난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유럽 의회 재선 연설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집행위원회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할 ‘청정 산업 협약(Clean Industrial Deal)’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재를 위한 ‘선도 시장(lead markets)’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유럽 철강업계는 기후친화적인 녹색철강 그린스틸 공공조달 및 의무구매 할당 관련 정책이 시행될 지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은 지금까지 수소 또는 전기에 기반한 그린스틸 생산을 늘리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써왔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럽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탄소가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더해 그린스틸 사용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시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유럽 철강업체들은 경제성을 감안하여 그린스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EU 정책의 초점이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악셀 애거트 사무총장은 “수소나 재생가능전기를 사용할 경우, 코크스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철강생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며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린스틸 생산 추가 비용을 전가할 수 없으며,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퍼는 그린스틸 생산비용이 기존 철강재에 비해 톤 당 300유로(44만 원) 정도 더 높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로퍼는 “전환기에 있는 산업은 청정제품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후친화적인 제품이 정착될 때까지 ‘녹색 선도 시장(green lead markets)’을 도입하고 EU 국가들은 공공조달, 제품 요구사항 및 표준을 통해 ‘메이드인 유럽’의 녹색제품을 지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자동차 업계도 그린스틸 사용 의무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느 일정량의 친환경 철강 사용을 의무화 하려는 EU의 법안에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투자비용 지원을 통해 촉진되어야 하는데, EU가 추진하려는 일종의 할당제는 수요 측면에선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아직까지 그린스틸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고비용 구조에 따른 공급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탄소화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린스틸 생산체로 전환될 수는 없다. 철강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경제성에 있다. 원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스틸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기존 방식에 비해 제조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매몰비용을 보느냐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철강 시장의 판도는 달라지게 된다.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업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의 지불을 감수하고 그린스틸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그린스틸 시장 형성에 관한 유럽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發 그린스틸 의무화 움직임 주목해야
- 철강
- 승인 2024.09.18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