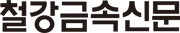中, 수출세·허가제 동시 검토…국내선 내수 방어·수출 경쟁 ‘양극 시나리오’ 대비 필요
중국이 자국 철강 반제품 수출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 채비다. 슬래브와 빌릿 등 연간 1,000만 톤 규모로 급증한 수출 물량을 조이기 위해, 수출세 부활과 수출허가제 병행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산업 고도화와 자원 보호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한국 철강시장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내수 방어와 수출 충돌, 공급 축소와 경쟁 과열이 맞물리며 ‘양면 효과’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반제품 수출 구조에 메스…中 “가치가 새고 있다”
중국강철공업협회(CISA)는 최근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에 철강 반제품 수출 제한을 공식 건의했다. 핵심 논리는 ‘양보다는 질’이다. 단순한 물량 차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저부가 수출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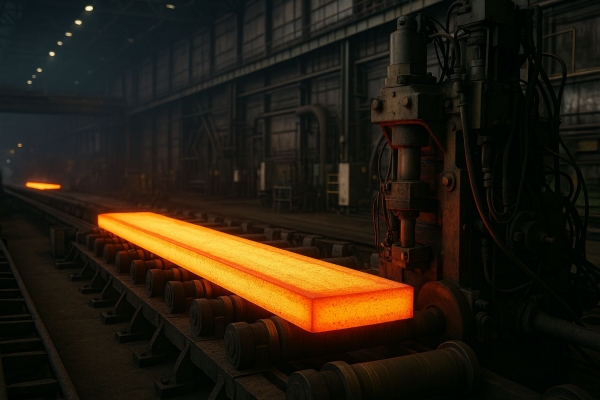
실제로 2025년 1~5월 기준 중국의 반제품 수출량은 47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폭증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이자, 연간 1,000만 톤 돌파가 확실시되는 흐름이다. 특히 중국은 경기 부진과 전방산업 침체를 배경으로 슬래브·빌릿을 중심으로 저가 수출을 확대해 왔으며, 이는 동남아 등 인접국에서 재가공·재수출 방식으로 변칙 활용되기도 했다.
CISA는 “반제품 수출은 누가 가공하고 가치를 챙기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저탄소 전환, 자원 절감, 산업 고부가화 등 정책 방향과 반제품 수출 억제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 슬래브는 줄고, 열연은 증가…완제품 ‘우회 수출’ 우려
중국의 반제품 수출 억제는 내수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슬래브는 중국 내 열연강판 등으로 가공돼, 다시 수출용 완제품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이에 중국 내 공급 과잉과 단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동시에 열연강판과 후판 등 완제품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이를 ‘방패와 창의 축 이동’으로 보고 있다. 수입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단은 국내 제조사에 내수 방어력과 가격 협상력을 부여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제품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산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한국산 제품이 동남아·중동 등에서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일부는 반제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 수혜와 구조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합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각국 규제도 연쇄작용…K-철강, 전략 재편 시급
중국산 반제품 수출이 급증하자, 주요국은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물론 베트남, 터키 등은 빌릿·슬래브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연계한 고탄소 제품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반제품 대부분이 고탄소(BF) 공정으로 생산되는 만큼,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이를 ‘탈탄소 역행’으로 간주하며 정책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제3국 우회수입 차단, 밀 테스트 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원산지 검증 강화 등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중국의 공급 전략이 완제품 확산으로 전환될 경우, 한국도 단순 차단을 넘어 시장 질서 재편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수출경쟁 넘어 구조 전환…‘이중 포트폴리오’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양극화 전략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강판, 친환경 강종 등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장기 계약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내수시장 중심의 안정적 가동 기반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반제품 셧다운이 단기 호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국내 철강사도 수출·내수의 균형 축을 재조정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가격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수출세나 허가제 같은 통상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며 “반제품부터 완제품, 고부가 강종, 탈탄소 규제, 수출 경쟁까지 전방위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철강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의 수출 규제는 완제품 확산, 시장 과열, 글로벌 규제 확대, 수출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도 중장기 통상 전략과 ESG 대응을 병행할 시점”이라며 “특히 ‘Made in Korea’를 앞세운 위장 수입이나 원산지 세탁 이슈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