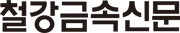철강산업은 산업화를 위한 기초 근간산업으로 1994년까지 정부에 의해 제품가격까지 통제받는 구조 속에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계획경제는 부족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경쟁보다는 독점적인 공급구조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철강재 대부분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것을 보완하고자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불가피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94년 2월 정부가 철강재 가격신고제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시장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해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반제품 및 철강 제품의 관세를 2004년까지 무세화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재 수입관세는 1996년부터 약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4년에 철광석, 유연탄 등 일부 원료를 제외한 철강재 및 반제품 모두가 무관세화된 바 있다.
사실 수입관세 무세화 선언과 가격신고제를 없앤 바탕에는 정부의 OECD 가입을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재해 있었다. 정부는 자유무역(Fair Trade) 및 시장경쟁의 대표산업이자, 선두주자로 철강산업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아주 높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결과 우리 철강산업에서 시장경쟁과 자유무역 환경 조성에 따른 경쟁적 시장구조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일찍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포스코의 민영화, 정부 지분 해외 매각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도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철강산업에서 완전 시장경쟁 체제는 이제 실로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중국, 일본의 저가를 무기로 한 국내시장 공략에 별다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또 정부도 인정했듯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경영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철강업계의 지속 생존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물론 최근 수입재의 유통시장 잠식 등 급격한 변화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혼란에 빠져 있고 일부는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변화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런 혼란의 시기에 정부가 가격 통제와 같은 시장개입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 이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만이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민관 모두 철저히 인정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철강시장, 경쟁이 생존과 성장의 기본이다
- 철강
- 승인 2012.07.18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