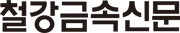설날이 저만치 다가왔다. 추석과 함께 우리의 최대 명절이다. 이 고유의 명절 설날 풍경이 시나브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화 했다.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지만 따스함과 정겨움이 넘쳐나던 모습은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편리함과 스마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설이 되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떡국을 먹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세뱃돈과 함께 정겨운 덕담이 오갔다. 그런 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른들을 찾아 세배를 올렸다. 하지만 이러한 미풍양속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설 분위기가 며칠간 계속되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가족끼리만 세배를 하거나 아예 모이지 않는 집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설 대표 음식인 떡국의 가래떡을 뽑기 위해 방앗간 앞부터 장터 골목을 따라 길게 줄을 서던 어머니들도 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계에서 한두 가락씩 나오던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가래떡은 먹기 좋고 보관하기 좋게 비닐봉지에 담긴 채 판매된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던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귀성 전쟁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고단함을 잊게 했다.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는 길이었지만 부모형제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힘들지 않았다. 이 같은 귀성전쟁도 흑백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남았다. 거미줄처럼 잘 발달된 고속도로와 고속열차를 통해 불과 몇 시간 안에 고향에 다다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데도 요즘 아이들은 잠깐 길이 막혀도 불평하며 불만을 터트린다.
잊히는 데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왜 이렇게 사무치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옛날은 가고 없지만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풍습이 없어지면서 고향도 점점 잊혀간다는 것이다. 바쁜 일로 고향에 내려가기 힘든 자식들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는 역귀성도 세태로 자리 잡았다.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낯설지 않다. 그러니 고향은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님 고향으로만 치부(置簿)하는 것도 섭섭하다.
시대의 변화는 이렇듯 다양한 신풍속도를 잉태하고 낳았다. 마음으로 전하던 세뱃돈도 기준이 정해지는 세상이다. 설문조사를 하면서까지 주고받는 자의 의중을 떠본다. 과잣 값으로 쥐어주던 세뱃돈의 액수가 부담스럽게 늘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졌다. 물가도 많이 올랐다. 세뱃돈도 같이 뛰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한 업체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뱃돈이 얼마가 적당한가의 물음에 42%가 5만 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답변도 42%나 되었다. 이 결과를 보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마음 씀씀이도 인정과 함께 메말라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설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둑한 보너스다. 연봉 체제로 바뀌면서 개념도 바뀌었지만 아직 중소기업들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5곳 중 2곳이 이번 설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1만 원으로 지난해 40만 원보다 늘었다. 아쉬운 것은 3곳은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직원들이 받을 상실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하니 이해는 가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때로는 낡은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유산이다. 각종 유형 및 무형문화재가 그것이다. 설날 풍습도 마찬가지다. 세배가 좋은 본보기다. 새해를 시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덕담은 세배를 하면서 나온다. 이것을 낡은 것으로 생각해 외면한다면 세대간 교감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키고 이어가야 하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설렘으로 기다려지던 유년의 설날 추억은 아직 기억속에 생생하다. 다만 돌이킬 수 없다는 아쉬움이 먹먹한 가슴을 애태울 뿐이다.
설날 세배를 하며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우리나라의 속설에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했다. 이처럼 복의 개념은 외연적(外延的) 의미도 일정하지가 않고 내포적(內包的) 의미도 분명하지 않으나,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복을 빌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복은 한국인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가장 보편적인 동기이다. 새해도 직장과 가정에 복이 철철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