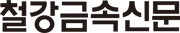올해 국내 철강시장의 특이점은 사실상 성수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 3월부터 5월이 성수기였고, 성수기를 앞둔 2월부터 건설을 포함한 각종 수요산업 부문의 발주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건설업을 포함한 주력산업이 극도로 침체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성수기가 사라진 효과는 판매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고,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성수기 진입에도 수요 부진과 중국산 수입재 대응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한 품목은 드물었다.
그런 와중에 고환율에 따른 원부재료 가격 인상과 중동전쟁에 따른 물류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제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결국 이는 상반기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급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철강시장을 바라보면서 불안한 점은 하반기의 성수기인 9~11월에도 상반기와 같은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9월에 접어들면 철강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의 회복과 휴가시즌 종료로 인한 제조업 공장 가동률 상승에 맞춰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특별한 제품 가격 인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된 일부 판재류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품목의 경우 성수기 진입에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외 수요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판매물량 감소와 제조원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도 인상하지 못하 경우 하반기에도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수요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최근 폭우와 가뭄 등으로 인해 여러 지자체의 사회기반시설 부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진했던 SOC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 주택시장 회복은 어려우나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은 오히려 건설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미진했던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 경기부양은 물론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철강업계도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수요 회복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