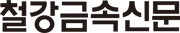기존 방열 소재 대비 2.6배 향상된 열전도도 및 친환경·저비용 공정 구현
수입에 의존하던 방열 인터페이스 재료 한계 뛰어넘고 국내 기술 자립 기대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최철진) 나노재료연구본부 차현애 박사 연구팀이 친환경성과 저비용 공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성능 방열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계란 흰자 기반의 단백질 발포 공정을 활용해 3차원 구조의 산화 마그네슘(MgO) 방열 소재를 개발했으며, 이 구조가 열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길을 형성해 기존 방열복합체 대비 최대 2.6배 높은 열전도도를 나타냈음을 확인했다.
전자기기의 고성능화와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열을 잘 식히지 못하면 성능 저하는 물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 인터페이스 재료(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이다.

기존 열 인터페이스 재료는 열을 전달하는 필러(입자 형태의 재료)를 고분자 재료에 섞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필러가 불규칙하게 섞여 열이 도중에 끊기고 충분한 성능을 내기 어려웠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러 함량을 늘리면 가공이 어려워지고 재료 비용도 커졌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고자 단백질 발포법을 이용해 입자들을 규칙적이고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계란 흰자에 들어 있는 단백질 성분이 고온에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 입자들이 연결된 3D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열 전달 경로가 끊기지 않고 촘촘하게 연결된 복합체를 만들 수 있었으며, 열전도도가 17.19W/mK(와트 퍼 미터 켈빈)에 달하는 고성능 열 인터페이스 재료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본 성과는 가볍고 저렴한 소재인 산화마그네슘(MgO)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물뿐만이 아니라 질화물 기반 방열 소재보다 더 높은 열전도 성능을 보인 게 장점이다. 또한, 에폭시 수지(접착력을 위해 방열 필러와 함께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와의 결합을 통해 실제 응용 가능한 복합체로 제작됐다.
이 기술은 전자기기, 반도체 패키지, 전기차 배터리, 5G 통신장비, 고성능 서버 등 고열이 발생하는 장치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방열 인터페이스 재료 시장은 연간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기술이 상용화될 때 국내 기술 자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차현애 선임연구원은 “단백질 발포 기반 공정을 통해 고열전도도 소재를 친환경적이고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경량 고성능 방열 소재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