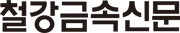철강업계의 힘겨운 사투가 눈물겹다. 눈앞에 닥친 침체의 파고(波高)가 심상찮다. 장벽을 넘어도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깐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각종 악재를 만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불황의 터널 끝은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급기야 국내 대표 철강사의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반도체 등 한참 잘 나가는 산업과 대비되는 현 상황을 역전시켜야 하지만 악재는 밀물처럼 밀려와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뒷걸음질 친 수출 실적에 업체마다 한숨이 깊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올해 상반기 평균 공장 가동률은 81.2%였다. 2022년 이후 하염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88.8%와 비교하면 7.6%p, 지난해와 비교해도 6.8%p 낮다. 이중 동국제강의 공장 가동률은 75.1%로 전년 88.6%보다 13.5%p나 하락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각각 3.6%p, 3%p 떨어졌다. 건설 등 수요산업 침체가 원인이지만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이 더 큰 영향을 미 쳤다. 이에 관계자들은 중국산 철강 제품 가격이 한국산 생산 원가보다도 낮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태”라며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다.
철강 수출 침체는 대중(對中) 철강 교역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철강 수출액은 2021년 3∼12월 한때 4억 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2022년 들어 3억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올해 들어서는 2억 달 러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대 중국 철강 수입액은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4·5월 각각 10억1,500만 달러, 10억3,8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10억 달러를 넘겼다. 이에 대 중국 무역적자는 2022년 9월 2억6,800만 달러 에서 지난 5월 7억5,100만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철강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철강재가 곳곳에서 우리의 앞 길을 막고 있다. 자국 수요 부진을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다 보니 ‘밀어내 기’ 식 저가 물량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이에 각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내수시장 방어를 위해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의 수출환경도 동반 악화하고 있다.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생존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이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면 안으로 문을 잠그는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빗장을 걸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문은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 다. 마치 자동문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국내 철강시장의 현실이다. 특히 중국산 유입이 그렇다. 중국산 후판 수입이 급증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 다. 조선업계에 국내산을 사용해 줄 것을 읍소하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현대제철이 보다 못해 나 홀로 반덤핑 제소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는 2년 후는 멀게만 느껴진다.
열간압연강판은 처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각국에서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반덤핑(AD) 조사와 조사 개시를 결 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 것이 확정되면 길 잃은 중국산 물량은 규제가 없는 국내로 유입될 것이 뻔하다. 열연강판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소재이다. 이 소재로 냉간압연강판과 강관을 생산한다. 중국산 소재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품질은 보장받을 수 없다.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공정 제품 질서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중국산을 꼭 막아야 하는 이유다.
철강사들은 지금 원가절감, 생산 최적화,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공비 절감과 원료 매입 채널을 다변화 하고 있다. 노후 설비 개선에도 적극적 이다. 신사업 확대와 시장 다변화에 집중하기도 한다. 생산 최적화를 위해 야간 조업 체제로의 전환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와중에도 중국산 철강 쓰나미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것을 버티지 못한 각국 철강업체들이 폐업 순서를 밟거나 잠정 휴업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국내 철강 산업은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 시황 둔화와 저가 수입재 유입 등이 큰 원인이다. 이에 신규 수요 창출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 해야 한다. 더불어 수입재에 지금처럼 문을 활짝 열어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 화할 것이다. 업계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이고 옮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